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제28집 2014. 10
\
한국사회에 반말공용화를 묻는다:
인지문화철학자의 반말 선언*[1]
김 광 식*
[논문개요]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순종과 복종의 문화가 삼백의 어린 청춘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 이 글은 순종과 복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지문화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반말공용화를 제안한다. 인지문화철학이란 인지현상에 대한 인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철학의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이다. 인지과학의 성과로는 리벳 실험과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삼는다.\
한국 사회 말의 역사는 높임말과 반말 싸움의 역사였다. 한국 사회 말의 역사는 반말 공용화로부터 윗사람의 반말과 아랫사람의 높임말을 거쳐 높임말 공용화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높임말 공용화라는 형식적 평등에 실질적 평등이 뒤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높임말 공용화는 겉보기일 뿐, 실제로는 윗사람은 은밀하거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고 아랫사람은 높임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순종과 복종의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그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려면 문어체 반말을 말과 글의 표준 꼴로 공용화해야 한다.
리벳 실험에 따르면 행동을 위한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 0.35초 전에 무의식적인 뇌활동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태도나 성향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말의 내용이나 머릿속 생각에 주목하는 메시지 주의로부터 말의 형식이나 몸에 밴 태도나 성향에 주목하는 싸가지 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에 따르면 앎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아니라 생명체의 몸에 밴, 앎을 만드는 내부 생산방식이다. 이것으로부터 듣는 이의 말뜻을 결정하는 것도 말하는 이의 말뜻을 담아 전달한다고 여기는 외부 세계의 말이 아니라 듣는 이의 몸에 밴, 외부 체계와 접속하여 말뜻을 만드는 내부 생산방식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듣는 말(뜻)에 주목하는 컨테이너 주의로부터 하는 말(뜻)에 주목하는 콘센트 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 데 듣는 싸가지 없는 반말보다 하는 싸가지 없는 반말이 더 효과적인 이유다.
반말로 맞서는 아랫사람이 잃을 것이라고는 순종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모든 아랫사람들이여, 반말로 단결하라.
주제분류: 인지철학, 문화철학, 사회철학
주 요 어: 반말공용화, 몸에 밴 앎, 인지철학, 인지문화철학,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
“가만히 있으라!” 이 한마디가 삼백의 어린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순종과 복종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 사회의 곳곳을 떠
돌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의 모든 세력이 이 유령을 좇아서 신성 동맹을 맺었다. 이제 반말주의자들이 전 한국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유령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말 선언으로 대체해야할 절호의 시기가 닥쳐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반말주의자들은 민주의 성지 광주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장. 높임말과 반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 말의 역사는 높임말과 반말 싸움의 역사였다. 일찍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나눔이 없던 때는 모든 사람이 서로 반말을 했을 것이다. 사회의 평등이 말의 평등을 낳았고, 말의 평등이 사회의 평등을 심화하는 착한 순환이 이루어졌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나눔이 생기고 난 뒤에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여전히 반말을 했지만, 이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반말이 아니라 높임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불평등이 말의 불평등을 낳았고, 말의 불평등이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나쁜 순환이 이루어졌다. 높임말과 반말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싸움
을 벌여 왔다. 한국 사회가 높임말을 공용화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어도 높임말과 반말 사이의 모순을 없애지 못했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 바꿔 놓았을 뿐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보통사람과 높임말 공용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는 윗사람과 늘 높임말을 하는 아랫사람이라는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모순을 단순화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달은 보통사람과 높임말 공용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는 정치적 윗사람과 경제적 윗사람, 사회문화적 윗사람을 낳았다. 보통사람과 높임말 공용화란 이름뿐만 아니라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윗사람은 잇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혁의 산물이다. 그들은 봉건 신분체제, 군주체제, 일제 식민체제, 미군 군정체제, 경찰 및 군사 독재체제에 맞서서 또는 빌붙어서 마침내 독점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배권을 쟁취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국가 권력은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는 윗사람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높임말 공용화는 한국 사회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것은 불평등한 봉건적 잔재들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낡은 봉건적 신분을 깨뜨리는 데 기여했다. 신분적 가치대신 보통사람이라는 평등한 인격적 가치를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높임말 공용화나 보통사람이라는 형식적 평등에 실질적 높임말과 실질적 보통사람이라는 실질적 평등이 뒤따르지 못했다. 높임말 공용화나 보통사람이라는 형식적 평등 아래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는 윗사람과 늘 높임말을 하는 아랫사람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 사람들 사이에는 위아래 관계 밖에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게 되었다. 윗사람들은 모든 인격적 관계를 위아래 관계로 해체했다. 아랫사람들은 지난한 싸움을 통해 쟁취한 수많은 자유대신에 단 하나의 자유, 곧 순종의 자유를 얻었다. 한마디로 윗사람들은 종교나 정치적 환상에 의해 가려져 있던 지배관계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도 잔인한, 높임말과 반말이라는, 명령과 순종이라는 위아래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윗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반말과 높임말이라는, 명령과 순종의 위아래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스승과 제자 관계도, 경찰과 시민 관계도, 공무원과 시민 관계도, 장관과 국민 관계도, 대통령과 국민 관계도, 국회의원과 국민 관계도, 판사나 검사와 시민 관계도, 의사와 환자 관계도, 남성과 여성 관계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관계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관계도,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도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반말과 높임말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인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반말과 높임말 관계로 보면 된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반말과 높임말 관계는 모두 인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위아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2장. 높임말 공용화와 반말 공용화
높임말 공용화는 앞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 역사에서 혁명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것은 신분의 가치대신 보통사람이라는 평등한 인격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높임말 공용화나 보통사람이라는 형식적 평등에 실질적 평등이 뒤따르지 못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 한, 실질적 말의 평등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높임말 공용화는 평등 관계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빈껍데기로 남았다. 높임말 공용화라는 형식 아래 실질적으로는 윗사람은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고, 아랫사람은 늘 높임말을 하였다. 윗사람의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반말과 아랫사람의 높임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효과를 낳았고, 아랫사람이 순종 또는 굴종하거나 체념하는 효과를 낳았다. 윗사람이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반말을 높임말로 바꾸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아랫사람이 순종 또는 굴종이나 체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득권을 스스로 순순히 내려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임말 공용화가 실패했다. 다시 말해 윗사람 높임말하기로 아랫사람 순종 벗어나기가 실패했다.
물론 높임말 공용화 도입의 맥락도 영향을 미쳤다. 높임말 공용화는 윗사람은 반말을 하고 아랫사람은 높임말을 하는 상태에서 끌어들여졌다. 아랫사람에게 말의 변화는 없었다. 윗사람의 형식적 높임말이 아랫사람의 실질적 높임말에 들어있는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형식적 말의 효과가 실질적 말의 효과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받는 말의 효과가 하는 말의 효과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실질적 말의 평등을 이루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평등을 앞당기는 데 말의 평등화 노력이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높임말 공용화로, 다시 말해 아랫사람이 듣는 말을 바꾸는 것으로, 곧 윗사람의 높임말 듣기로 아랫사람의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는 것은 실패했다. 말의 상향 평준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랫사람이 하는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하는 말에서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아랫사람이 하는 말을 바꾸어야 한다. 아랫사람이 여전히 높임말을 하는 한,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기란 쉽지 않다. 아랫사람이 반말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다. 아랫사람은 반말을 하고 윗사람은 높임말을 하는 방법과 둘 다 반말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것은 아랫사람에게 유리한 말의 차등을 통해 순종의 관성 걷어내기의 효과를 높이려는 방법이다. 하지만 윗사람의 높임말이 아랫사람에게 부담을 주어 반말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듣는 말의 효과보다 하는 말의 효과가 크다면,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부담을 주어 반말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윗사람의 높임말대신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서로 반말을 하게 하는 말의 하향 평준화가 아랫사람의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반말은 원래 거스르거나 맞서는 반말(反-)도 아니며, 깎아 버려 낮추는 반말(拌-)도 아니며,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딱 중간의 평등한 반말(半-)이다. 말의 본뜻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반말보다 평등말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 하지만 아랫사람의 반말(半-)은 윗사람의 권위를 거스르거나 그것에 맞서는 반말(反-)이기도 하므로 이중적인 의미로 반말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 하지만 반말은 깎아 버려 낮추는 반말(拌-)의 뜻도 있으므로 윗사람의 반말이 아랫사람의 가치를 깎아 버려 낮추는 원치 않는 효과도 있다. 더 나아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의 반말이 평등말이 아니라 윗사람의 가치를 깎아 버려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윗사람의 저항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어체 반말을 구어체 반말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어체 반말은 오랫동안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평등말로 사용되어 왔다. 평등말로 써진 학생의 답안지나 사원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선생이나 사장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 버려 낮추는 반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영어처럼 평등말을 문어체와 구어체 구분 없이 쓰자. “You are a president.”처럼 쓰거나 말하자. 다시 말해 “너는 대통령이다.”라고 쓰거나 “너는 대통령인가?”라고 쓰고 말하며, “너는 대통령 하시오 또는 하지 마시오.”라고 쓰거나 말하자. 누구 말대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어떤 윗사람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신이 아니다. 나와 너와 같은 평등한 인
간일 뿐이다.
\
3장. 메시지 주의와 싸가지 주의[2]
- 말의 내용과 형식
어느 시대든 말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사이에 메시지 주의와 싸가지 주의의 다툼이 있었다. 물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행동이다. 물리적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말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말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이 직접 행동을 일으킬 수는 없다. 말은 듣는 이의 이성이나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이성이나 감성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달리 말해 ‘가만히 있는’ 행동방식을 ‘가만히 있지 않는’ 행동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이성일까, 감성일까? 이성은 말의 내용에 예민하며, 감성은 말의 형식에 예민하다. 말의 내용에 예민한 이성이 행동방식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메시지 주의라면, 말의 형식에 예민한 감성이 행동방식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싸가지 주의다. 물론 두 입장 모두 내용이나 이성만 중요하다든가 형식이나 감성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은 주로 메시지 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다. 더 나아가 이러저러한 세상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말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현실 비판과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다고 몸까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이해를 넘어 몸으로 행동하는 몸에 밴 용기나 태도가 필요하다. 어쩌면 몸에 밴 용기나 태도가 없으면 이해도 어려울 수 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태도가 몸에 밴 이는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보수적인 생각이 보수적인 태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태도가 보수적인 생각을 낳는다.
의식적인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오래된 빛바랜, 하지만 여전히 먹히는 끈질긴 신화다. 지금 왼손을 들어보라. 왼손을 들겠다는 의식적인 생각을 몸이 단순히 수행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이 왼손을 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왼손을 들겠다는 의식적인 생각은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이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비쳐진 것에 지나지 않다. 미국의 생리학자 리벳Benjamin Libet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3] 실험 대상자에게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 때나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했다. 실험 대상자들이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한 순간과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인 순간은 거의 일치했다(약 0.2초 후). 하지만 뇌파 측정기(EEG)로 측정한 결과,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기 0.35초 전에,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0.55초 전에 이미 특정한 뇌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냈다.[4]
의식적인 뇌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가, 즉 몸이 스스로 명령을 내렸다. 무의식적인 뇌가, 즉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을 손가락이, 즉 다른 몸이 수행했다. 의식적인 생각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인인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을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비쳐 알리는 앵무새 대변인의 역할을 할 뿐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화적인 의식적 행동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는 무의식적인 몸이고, 그 시나리오를 생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는 영화감독이 바로 의식적인 뇌다. 그러므로 이야기 흐름을 바꾸려면, 스크린에 비쳐진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영화가 아니라 먼저 시나리오를 바꿔야 한다. 아무리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고쳐먹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는 태도나 용기가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은 머릿속 생각에 주목하는 메시지 주의로부터 몸에 밴 태도에 주목하는 싸가지 주의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말의 내용에 예민한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말의 형식에 예민한 몸에 밴 태도에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들을 ‘싸가지 없는’ 태도를 버리고 ‘싸가지 있는’ 태도로 대하라는 게 아니다. 물론 태도가 걸맞으면 메시지 전달에 저항은 작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싸가지 있는’ 태도로 가공하여 받아들인다. ‘싸가지 있는’ 태도로 가공하여 받아들인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몸에 밴 태도가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일으키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편화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들의 몸에 밴 ‘가만히 있는’ ‘싸가지 있는’ 태도를 바꿔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싸가지 없는’ 태도의 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를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로 바꾸기는 어렵다. ‘싸가지 없는’ 태도는 듣는 말보다 하는 말의 반복으로 몸에 배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싸가지 없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 데 반말공용화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
4장. 컨테이너 주의와 콘센트 주의- 듣는 말과 하는 말
흔히들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한다. ‘아’와 ‘어’가 다르게 들린다는 뜻일 게다. ‘조용히 하세요.’와 ‘입 다물어’가 다르게 들린다는 말이다. 앞의 표현이 뒤의 표현보다 기분 좋게 들린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흔히들 말을 주고받는 것은 뜻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일컬어 컨테이너 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말하는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말이란 컨테이너에 담아 전달하고 듣는 이는 말이란 컨테이너에 담긴 뜻을 꺼내어 전달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시지 주의자에게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에 담긴 뜻과 ‘입 다물어’라는 말에 담긴 뜻은 같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싸가지 주의자에게 이 두 말의 뜻은 다르다.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에는 존중의 뜻이, ‘입 다물어’라는 말에는 무시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메시지 주의자에게든 싸가지 주의자에게든 말이란 말하는 이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 컨테이너다. 그런 점에서 둘은 모두 컨테이너 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성공했는지는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인지철학자 마뚜라나Humberto Maturana는 비둘기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5] 외부세계 빛의 특정한 파장과 망막의 신경절 세포들의 활동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망막의 신경절 세포들의 활동과 시각중추의 활동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외부세계 빛의 특정한 파장과 망막의 신경절 세포들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망막의 신경절 세포들의 활동과 그가 지각한다고 말하는 색 이름들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색 이름 말하기는 시각중추의 활동이다.
망막의 시세포와 신경절 세포는 빛이라는 물리적 신호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망막의 시세포와 신경절 세포는 신경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신경계의 입구다. 신경계 밖의 변화(빛 파장의 변화)와 신경계 입구에서의 상태변화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는데, 신경계 입구에서의 상태변화와 신경계 안방이나 출구의 상태변화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신경계 출구를 빠져나오는 신경계의 출력물인 앎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신경계 밖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 안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을 뜻한다.\
마뚜라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흔히 시각 경로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빛의 정보가 동공 → 망막 → 시신경 → 시신경교차 → 외측슬상체 → 후두엽(시각중추)의 순서로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앞의 비둘기 실험이 빛의 정보가 망막을 통과하면서 뒤틀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마뚜라나는 그 뒤틀린 것이 외측슬상체에서 신경계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시각중추에 전달된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상구, 시상하부 등 여러 곳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데 주목할 것은 외측슬상체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후두엽(시각중추)으로부터도 거꾸로 간섭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자기 되먹임(recursion)야말로 몸에 밴 앎의 핵심이다. 앎을 머릿속에 들어온 외부세계의 객관적인 정보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이 자기 되먹임 때문이다. 이 자기 되먹임 때문에 앎은 우리 몸이 거듭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몸에 밴 행위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앎이 몸에 밴 행위방식이라면 앎은 곧 함이
고 함은 곧 앎이라고 할 수 있다. 마뚜라나는 이러한 (시각적) 앎을 생산하는 과정의 자기 되먹임 현상을 ‘자기생산’(autopoiesis)이라고 불렀다.[6]
앎의 자기생산적 특성으로부터 말(의 뜻)의 자기생산적 특성을 끌어낼 수 있다. 앎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 세계의 자극(정보)이 아니라 생명체의 몸에 밴, 앎을 만드는 내부 작동방식이라면 듣는 이에게서 말의 뜻(앎)을 결정하는 것도 외부 세계의 말(또는 그 속에 담긴 뜻)이 아니라 듣는 이의 몸에 밴, 뜻(앎)을 만드는 내부 작동방식이다. 말은 뜻을 담아 전달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다. 말은 말하는 이의 말(의 뜻)과 듣는 이의 말(의 뜻)이 접속하는 콘센트다. 전기회로 체계 속을 흐르는 전기의 기능(뜻)과 선풍기 체계 속을 흐르는 전기의 기능(뜻)은 다르다. 전기는 전기회
로 체계로부터 선풍기 체계로 들어왔지만 전기회로 체계 속 기능이 선풍기 체계 속 기능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선풍기 체계 속 기능(바람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만든 것은 전기회로 체계 속 외부 기능이 아니라 선풍기 체계 속에서 그 기능을 만드는 내부 작동방식이었다. 두 기능(뜻) 체계는 콘센트를 통해 접속하여 에너지를 주고받을 뿐, 기능(뜻)을 담아 전달하지 못한다. 말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는 이들을 콘센트 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조용히 하세요.’라는 외부 세계의 말은 듣는 이의 말뜻을 만드는 내부 작동방식에 따라 ‘존중의 뜻’으로 들릴 수도 있고 ‘무시의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듣는 이의 몸에 밴 듣는 태도에 달렸다. 우호적 태도로 그 말을 듣는다면 존중의 뜻으로 들을 것이며, 적대적 태도로 듣는다면 무시의 뜻으로 들을 것이다. 말뜻을 결정하는 몸에 밴 태도는 말뜻을 생산하는 그
이전의 몸에 밴 태도들이 자기 되먹임 되며 수렴된 결과다.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는 싸가지 없는 태도로 끊임없이 자기 되먹임하며 말뜻을 생산하는 적극적 말 행위의 반복을 통해 몸에 배게 된다. 태도가 몸에 배는 것은 태도가 끊임없이 자기 되먹임 한 결과다. 태도가 말(뜻)을 낳고 그 말(뜻)이 또 다른 태도를 낳는다. 달리 말해 태도는 한편으로 말(뜻)을 낳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말뜻을 생산하는) 또 다른 태도를 낳는다. 따라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듣는’ 외부의 말(뜻)이나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부 말(또는 그 말뜻을 생산하는 태도)이다. 싸가지 없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 데 듣는 싸가지 없는 반말보다 하는 싸가지 없는 반말이 더 효과적인 이유다.\
5장. 반말로 단결하라
높임말 공용화라는 말의 형식적 평등은 봉건적 신분의 불평등을 깨뜨리는 혁명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높임말 공용화라는 말의 형식적 평등은 말의 실질적 불평등과의 모순을 심화시켜서 한편으로는 순종과 복종의 관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거스름과 맞섬의 욕구를 키웠다. 순종과 복종의 관성과 동반 성장한 거스름과 맞섬의 욕구는 이제 높임말 공용화라는 형식의 존립을 위협한다. 봉건적 신분의 불평등에 거스르고 맞섰던 그 무기가 이제 말의 실질적 불평등 위에 올라서 있는 위아래 관계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다. 위아래 관계는 한편으로 순종과 복종의 관성에 머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거스름과 맞섬의 욕구를 들춰보는 아랫사람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무시와 억압, 순종과 굴종이란 말의 비뚤어진 관계를 뒤집어 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단결하기 시작했다. 높임말의 몰락과 반말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반말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여긴다. 반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비뚤어진 말의 질서를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윗사람들로 하여금 반말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맞서라. 반말로 맞서는 아랫사람이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순종과 굴종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
모든 아랫사람들이여, 반말로 단결하라!
참고문헌
\
- 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인물과 사상사, 2014.
- 김광식,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언어폭력(1): 언어폭력의 생물학적 해부」, 비폭력연구2권, 2009.,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의 인지생물학적, 사이버네틱스적 해부」, 사회와 철학26, 2013.
- 마뚜라나와 바렐라, 앎의 나무, 최호영 옮김, 갈무리, 2007.
- 박주용, 「자유의지에 대한 리벳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 홍성욱 외, 2012.
- 최훈, 「신경과학은 자유의지에 위협이 되는가?」, 홍성욱 외, 2012.
- 홍성욱 외, 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2012.
- Kwangsik Kim, Handlungswissen als verkörperte Handlungsweise: Eine philosophische, wissens- und kulturtheoretische Studie über den Radikalen Konstruktivismus, 29-30
- Libet, B./C. A. Gleason/E. W. Wright/d. K. Peral, “Time of conscious intention to act in relation to onset of cerebral activity(readiness -potential): The unconscious initiation of a freely voluntary act” Brain 106, 1983, 623-642
- Libet, B., “Unconcious cerebral initiative and the role of conscious will in voluntary action”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8, 1985, 529-66, Haben wir einen freien Willen?, in: Christian Geyer(H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Zur Deutung der neuesten Experimente, Suhrkamp, 2004, S. 268ff.
- Maturana, H. R./F. J. Varela, Der Baum der Erkenntnis: Die biologischen Wurzeln des menschlichen Erkennens, Goldman, Bern, 1990., The Tree of Knowledge, Boston, 1987
- Soon, C./M. Brass/H. Heinze/J. Haynes,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oscience 11(5), 2008, 543-545.
\
Für die gemeinsame Nutzung von Duz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Duzen-Manifest einer kognitiv-kulturellen Philosoph
Kim, Kwangsik
【Abstract】
Es war die Kultur des Gehorsams, die etwa dreihundert junge Menschen in den Tod in der Katastrophe von Sewol-ho fuhr. Dieser Artikel schlagen die gemeinsame Nutzung von Duz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vor, um die Kultur des Gehorsams zu verändern, auf Grund der kognitiv-kulturellen-Philosophie. Die kognitiv- kulturelle-Philosophie nähert Probleme der sozial-kulturellen Philosophie auf der Grundlage der Kognitionswissenschaft. Dieser Artikel basiert auf Libet-Experiment und Theorie der Maturans autopoietischen
Systemen.
Die Geschichte der Sprach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ist die Geschichte des Kampfes zwischen Duzen und Siezen. Die Geschichte der Sprach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ging von der gemeinsamen Nutzung von Duzen aus, hat durch die Phase des Duzens von höherer Klasse und des Siezen von der Unterschicht zur gemeinsamen Nutzung des Duzens gelaufen. Aber die wirkliche soziale Gleichheit folgte die formale Gleichheit des Siezens nicht. Deshalb ist die gemeinsame Nutzung des Siezens ist nur das Aussehen, aber die Realität ist die Tatsache, dass die höhere Klasse duzt heimlich oder offen, die Unterschicht siezt. Daher ist die Kultur des Gehorsams dominant in der Unterschicht. Ich schlage die gemeinsame Nutzung des Duzens mit
Schriftsprache vor, um sie die Tragheit des Gehorsams loszuwerden.
Nach der Libet-Experiment beginnt die unbewusste Tatigkeit des Gehirns ca. 0.35 Sekunden vor der bewussten Absicht der körperlichen Bewegung. Daraus folgt, dass nicht der bewusste Gedanke sondern die unbewusst verkörperte Disposition oder Einstellung die Handlung für die Veränderung der Welt führt. Das bedeutet, dass diejenigen, die versuchen, die Welt zu verändern, von der Orientierung auf den Inhalt der Sprache zur Orientierung auf die Form der Sprache umorientieren sollten.
Nach der Maturana’s Theorie der autopoietischen Systeme bestimmt nicht die Information der Aussenwelt sondern die innere eigene verkörperte Produktionsweise des Wissens den Inhalt des Wissens. Daraus folgt, dass nicht die Sprache der Aussenwelt, die die Bedeutung der Sprache wie ein Kontainer beinhaltet, sondern die innere eigene verkörperte Produktionsweise der Sprache, die die Bedeutung der Sprache wie ein Steckdose in der Koppelung mit der Aussenwelt produziert, die Bedeutung der Sprache beim Hörer bestimmt. Das bedeutet, dass diejenigen, die versuchen, die Welt zu verändern, von der Orientierung auf das Hören bzw. das Verbrauchen der Sprache zur Orientierung auf das Sprechen bzw. das Produkzieren der Sprache umorientieren sollten. Das Duzen des Sprechers ist effizienter als das Duzen des Hörers, um die verkörperte gehorsame Einstellung loszuwerden.
Die duzende Unterschichte haben nichts in ihr zu verlieren als ihre Gehorsamkeit. Sie haben eine Welt zu gewinnen. Alle duzende Unterschichte,
vereinigt Euch!
\
- Subjekt Bereiche: Kognitive Philosophie, Kulturphilosophie, Sozialphilosophie\
- Stichworte: Die gemeinsame Nutzung des Duzens, Verkörpertes Wissen, Kognitionswissenschaft, Kognitiv-kulturelle-philosophie, Maturana’s Theorie der autopoietischen Systeme
논문접수일: 2014년 9월 17일 논문심사일: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10월 27일
* 이 글은 사회와 철학 연구회 하계 심포지엄(2014년 6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열띤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진보(인물과 사상사, 2014)와 관련된 논쟁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다만 논쟁에 등장하는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글의 맥락에 맞는 의미로 고쳐 사용하였다. ↩︎
리벳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 Libet, C. A. Gleason, E. W. Wright, & d. K. Peral, “Time of conscious intention to act in relation to onset of cerebral activity(readiness-potential): The unconscious initiation of a freely voluntary act” Brain 106, 1983, 623-642; Benjamin Libet, “Unconcious cerebral initiative and the role of conscious will in voluntary action”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8, 1985, 529-66; Benjamin Libet, Haben wir einen freien Willen?, in: Christian Geyer(H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Zur Deutung der neuesten Experimente, Suhrkamp, 2004, S. 268ff. 리벳 실험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주용, 「자유의지에 대한 리벳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과 최훈, 「신경과학은 자유의지에 위협이 되는가?」. 이 두 글은 홍성욱 외, 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2012의 4부에 있다. 이 글은 리벳 실험을 의식적 생각의 인과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사례로 여기고 논의를 펼친다. ↩︎
2008년 순(C. Soon) 등은 자기공명영상 장치(fMRI)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손가락 움직임 결정을 내리기 7~10초 전에 뇌 활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참조: Soon, C., M. Brass, H. Heinze, and J. Haynes (2008)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oscience 11(5): 543-545. ↩︎
비둘기 실험과 색이름 말하기 실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wangsik Kim, Handlungswissen als verkörperte Handlungsweise: Eine philosophische, wissens- und kulturtheoretische Studie über den Radikalen Konstruktivismus, 29-30 참조. ↩︎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마뚜라나와 바렐라, <앎의 나무>, 최호영 옮김, 갈무리, 2007; 김광식,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언어폭력(1): 언어폭력의 생물학적 해부」, 비폭력연구2권, 2009, 107-125; 김광식,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의 인지생물학적, 사이버네틱스적 해부」, 사회와 철학26, 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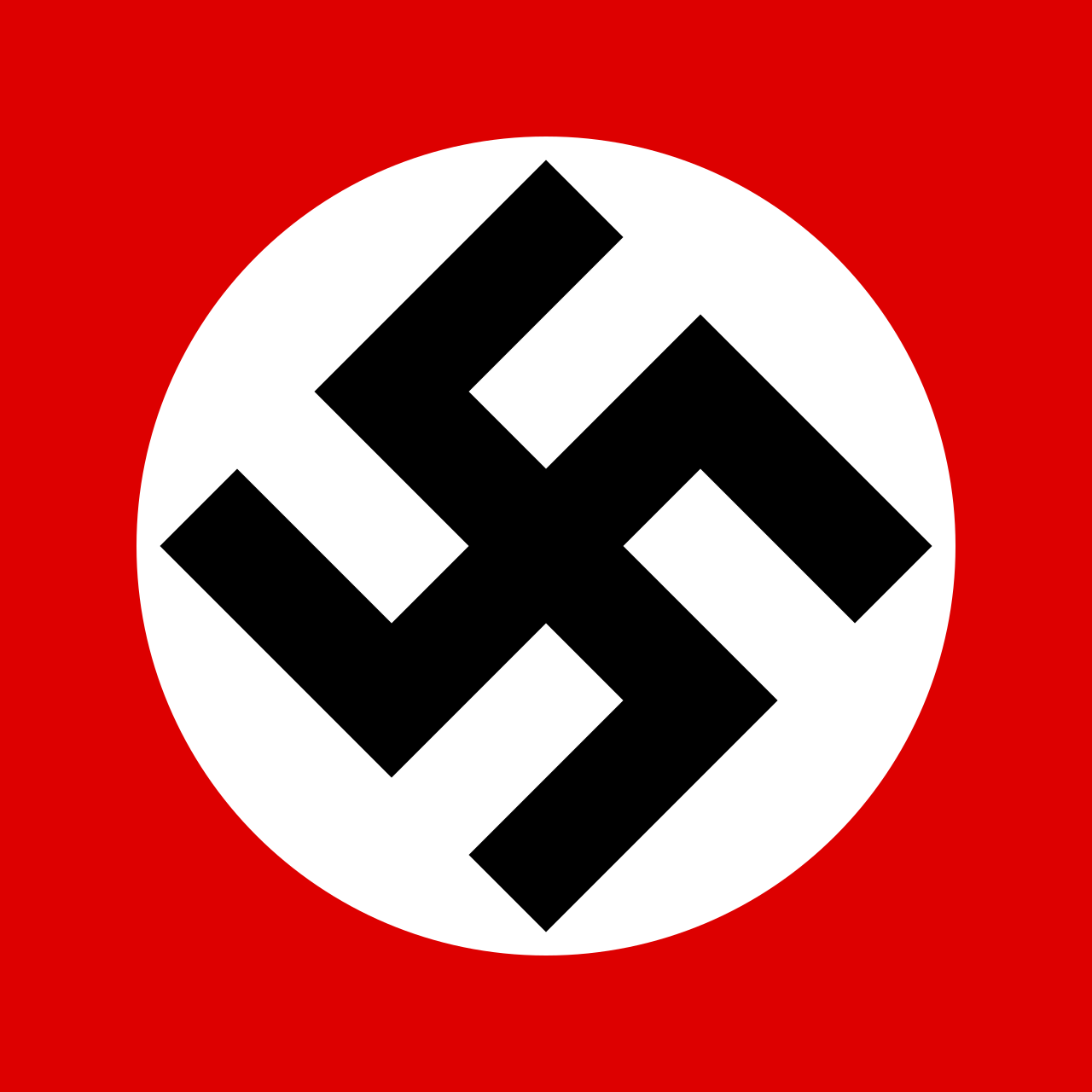

한국사회에 반말공용화를 묻는다: 인지문화철학자의 반말 선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24170